 |
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'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와 디지털 금융 이용 행태' 보고서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. 가구당 연소득 7000만원 이상~1억2000만원 미만인 4000명의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9~10월 설문조사를 벌였다.
우리금융은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에 속하는 대중부유층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. 이번엔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삼았다.
 |
올해 대중부유층의 총자산은 평균 7억6500만원이었다. 이 중 부채 1억190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6억4600만원으로 조사됐다.
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.6%로 지난해와 비슷했다. 금융자산은 18.9%였다. 부동산 자산은 6억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었고, 금융자산은 1억2600만원으로 2400만원 증가했다.
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선 변화가 생겼다. 예·적금 비중이 지난해보다 5%포인트 줄어든 대신 주식 비중은 3%포인트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다. 예·적금과 주식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%, 15.4%였다.
응답자들은 앞으로도 주식 비중을 늘리고 예적금 비중을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. 주식 비중을 1.7%포인트 늘려 17.1%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대중부유층은 지난해보다 위험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졌다. 지난해엔 안정추구형, 안전형이 60%였지만 올해는 41.2%로 뚝 떨어졌다. 반면 적극투자형, 공격투자형은 33.7%로 10%포인트 늘었다. 시중금리가 낮아져 수익을 내려면 위험 감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.
대중부유층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디지털 금융 이용도가 늘었다고 답했다. 언택트(비대면) 자산관리 채널을 이용한 경험자는 지난해 11%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6.6%로 부쩍 많아졌다.
응답자의 95.1%는 평소에 금융 앱(애플리케이션)을 사용했다.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은 73.8%로 나타났다. 응답자들은 '개인 맞춤 상품 추천'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.
대중부유층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, 가장 기대되는 회사로 카카오뱅크를 꼽았다. 응답자의 27.8%가 카뱅, 13.4%는 네이버를 지목했다.
우리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"그동안 고액자산가 위주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대중부유층은 다소 소외됐다"며 "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중부유층에 특화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수익기반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"고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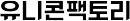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




![[단독]캐롯손보, 6년만에 한화손보에 흡수합병 유력](https://thumb.mt.co.kr/11/2025/04/2025040907191466947_1.jpg/dims/resize/100x/optimize/)
![[단독]인수 가능성 커졌다..우리금융 보험사 편입심사 이달 결론](https://thumb.mt.co.kr/11/2025/04/2025041115451515623_1.jpg/dims/resize/100x/optimize/)
![이효리 사는 그 동네, 어르신 몰려간 까닭[르포]](https://thumb.mt.co.kr/11/2025/04/2025040914001249049_6.jpg/dims/resize/100x/optimize/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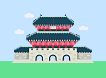


![박나래, 경찰 출석 오보 "변호인단이 참석해 피해 진술" [공식]](https://thumb.mtstarnews.com/05/2025/04/2025041518201861421_1.jpg)











![지지율 급상승한 젤렌스키, 트럼프의 안전보장 약속 받아 낼까 [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]](https://i1.ytimg.com/vi/DaORMfdYqK0/hqdefault.jpg)
!["도주원조죄, 내가 찾아냈다...윤석열 대통령, 개인 아닌 권력기관" 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4.ytimg.com/vi/sL2Wc-4dN8w/hqdefault.jpg)

![주진우 "이재명 선거법 2심 형량, OOO 예상…조기대선 열려도 확장성에 한계"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1.ytimg.com/vi/PfQC-0KVTzU/hqdefault.jpg)




![트럼프 '관세 때려도 물가 괜찮아', '제조업 살리며 달러 패권 유지'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? [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]](https://i2.ytimg.com/vi/ARkPmfo4HFA/hqdefault.jpg)
![김문수·오세훈·한동훈·홍준표...이재명에 맞서 보수를 구원할 주인공은 누구? 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3.ytimg.com/vi/rStQFWAQf7A/hqdefault.jpg)
!['해적'과 '악동', 일론 머스크의 '화성 정복'의 꿈을 설명하는 키워드 [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]](https://i4.ytimg.com/vi/GYkGC6b1118/hqdefault.jpg)
![김태년 "문모닝 하던 국민의힘, 이제는 명모닝...이재명만 찾다간 필패"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2.ytimg.com/vi/YFL30LR1RRE/hqdefault.jpg)




![부산, 북극항로의 최고 요충지로 열강의 타겟이 될 것[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]](https://i1.ytimg.com/vi/phdvUDIWKQ8/hqdefault.jpg)
![이건태 "헌법재판소, 장담컨대 '윤석열 탄핵 기각' 결정문 쓸 수 없을 것"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1.ytimg.com/vi/PXy1sPAoI08/hqdefault.jpg)
![정성국 "한동훈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가장 먼저 할 말은? ...'尹 배신자 프레임', 이렇게 해결 가능" 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3.ytimg.com/vi/fb3HnFFMCXU/hqdefault.jpg)
![이준석 "이재명, 조기대선 후보직 박탈될 수도...맞붙고 싶은 여당 상대는 OOO"[터치다운the300]](https://i3.ytimg.com/vi/vqVgcCfuxXM/hqdefault.jpg)
